https://brunch.co.kr/@cosmos-j/1382
홀로 ‘얼음’이던 때, “이제 땡이에요”라며 다가오는
윤성희 소설집 ‘날마다 만우절’(문학동네, 2021) | 윤성희 소설에는 수많은 죽음들이 등장한다. 아버지가 목을 매 죽거나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아버지의 친구가 죽는다. 죽
brunch.co.kr
윤성희 소설에는 수많은 죽음들이 등장한다. 아버지가 목을 매 죽거나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아버지의 친구가 죽는다. 죽지 않으면 다친다.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거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다 차에 치이거나 운전 중 뒷차가 받고 그 충격으로 앞차를 받는다. 어떤 만남은 장례식장에서 일어나거나 장례식장 근처에서 일어난다. 그렇지만 『날마다 만우절』(문학동네, 2021)은 마치 표제작의 제목처럼, 거짓말 같이 수많은 상실들을 지나 엉망진창인 삶의 오늘을 지나 내일을 견디기 위해 노력할 힘을 얻게 해준다.
⠀
“아이는 또 걸었다. 나는 걸음을 빨리해 아이를 지나쳤다. 지나치면서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니 울고 있었다. 아이를 혼내려 했는데 우는 모습을 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비닐이 찢어진 그 자리에만 앉았다. 누군가 거기 앉아 있으면 나는 앉지 않고 서서 갔다. 그러면서 울던 그 아이를 생각했다.”
-189쪽, 「눈꺼풀」에서
⠀
“일상을 회복하는 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농담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대놓고 우리를 정색하게 만드는 위로나 충고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농담은 상처를 겪은 사람이 그 상처에서 한발 물러났을 때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작가가 쓴 소설에서, 섣불리 위로하려 들지 않으면서도 내내 곁에 머무르며 낙관을 잃지 않는 문장을 읽는다. 냉소하는 듯하지만 사람은 타인으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괜찮다”, “착하다” 같이 아이에게 할 법한 말을 어른에게도 해주는, 그리하여 작은 다정함을 불러일으키는.
⠀
소설집으로 묶인 단편들 속 주인공들은 10대부터 할머니까지 다양하지만 어떤 이들은 얼핏 서로 같거나 닮은 사람인 것처럼 읽히기도 한다. 가령 “말린 단풍잎을 책갈피로 쓰던”(10쪽, 「여름방학」) ‘나’와 “책갈피에 단풍잎을 끼워두는”(107쪽, 「어느 밤」) ‘나’라든지. 혹은 “손자에게 아직도 엄마에게 혼나는 꿈을 꾼다고 말해주”(75쪽, 「남은 기억」)는 ‘영순’과 “새끼손까락을 걸고 약속을 했다. 그러자 이 모든 게 내가 어젯밤 꾼 꿈처럼 느껴졌다”(139쪽, 「어제 꾼 꿈」)라고 하는 ‘나’라든지. 그들은 저마다 감당하기 벅찬 역사를 살아내는 중이고, 그것들은 소설이 된다.
⠀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불과 마침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있기도 하다.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얼핏 “주로 사소하고 시시한 이야기”인 듯 보이지만 여기에는 반짝일 듯 말 듯한 보석들이 속속들이 숨어 있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놀이터에 세워져 있던 한 아이의 킥보드를 몰래 훔쳐 타던 며칠의 밤 안에 몇 년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인문대 앞 매점에서 바나나우유를 사던 두 사람의 표정과 그 두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맞은편 종합병원 후문의 장례식장 네온사인을 보며 짓는 미소가 여러 해의 간격을 두고 제법 닮았을지도 모른다고 느끼며 그 사이에 몇 번의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나 세어보기도 한다.
⠀
마침 소설집의 첫 단편 제목이 「여름방학」이어서, 두 해 전 여름에 읽은 시집 속 한 부분을 떠올린다.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시간은 반으로 접힌다/ 펼쳐보면 다른 풍경이 되어 있다" (안희연,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창비, 2020))
⠀
‘작가의 말’에는 “위로를 준다는 말이 무서워 나는 부러 냉소적으로 생각해보려 했다. 소설이란 그렇게 쓸모가 있는 장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 켠에서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311쪽)라는 대목이 있다. 「어느 밤」 식으로 말하자면 『날마다 만우절』은 얼음땡 놀이를 하는데 아무도 땡을 해주지 않아 혼자 얼음이 되어 있던 어느 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누군가 작은 우산을 씌워주면서, “이제 땡이에요”라고 말해주며 젖은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이 곁으로 다가온다. 연휴를 보내며 오간 기차 여정이 소설집 한 권 덕분에 가만히 소설이 되었다. 이미 윤성희의 다른 소설집을 하나 더 장바구니에 넣었다. (2022.02.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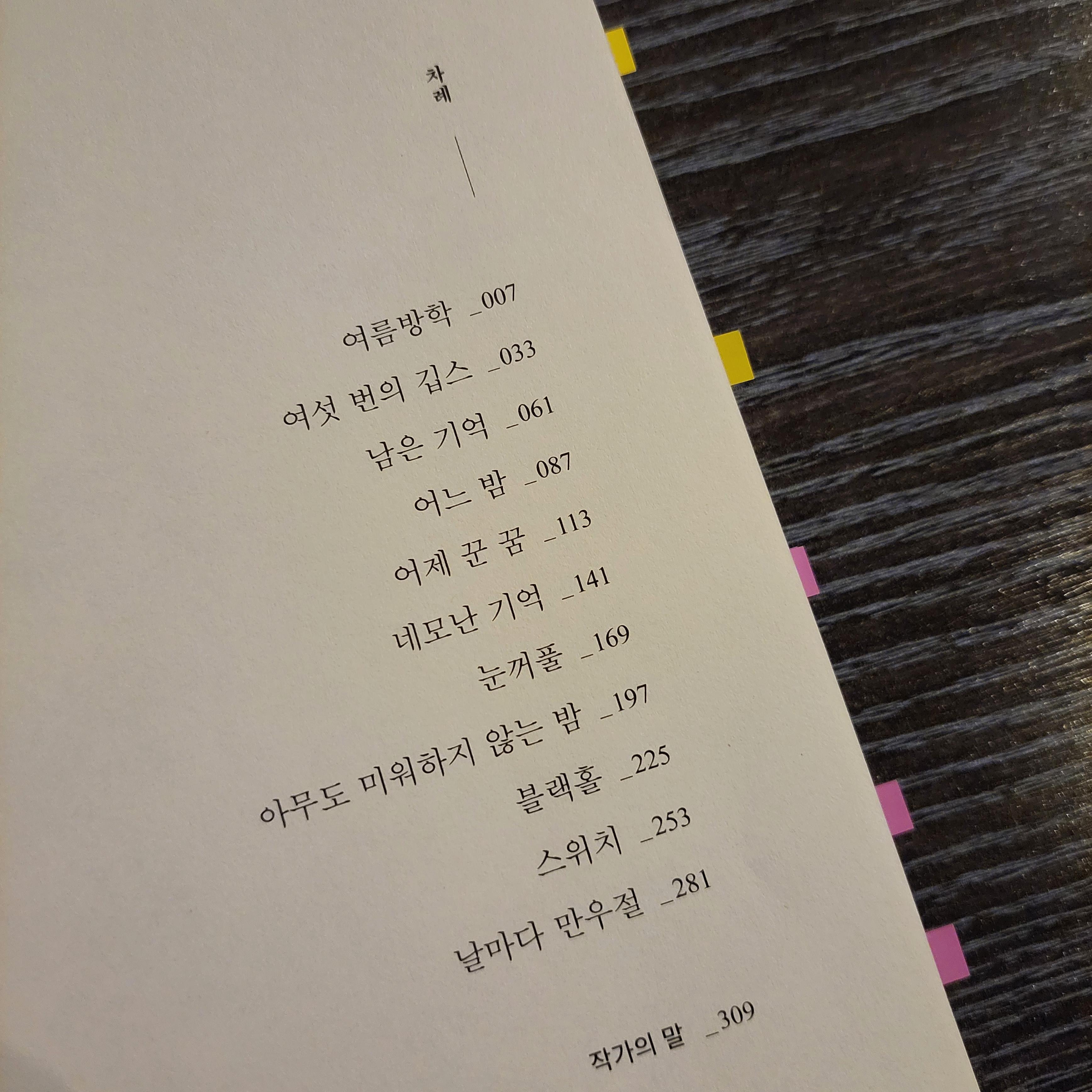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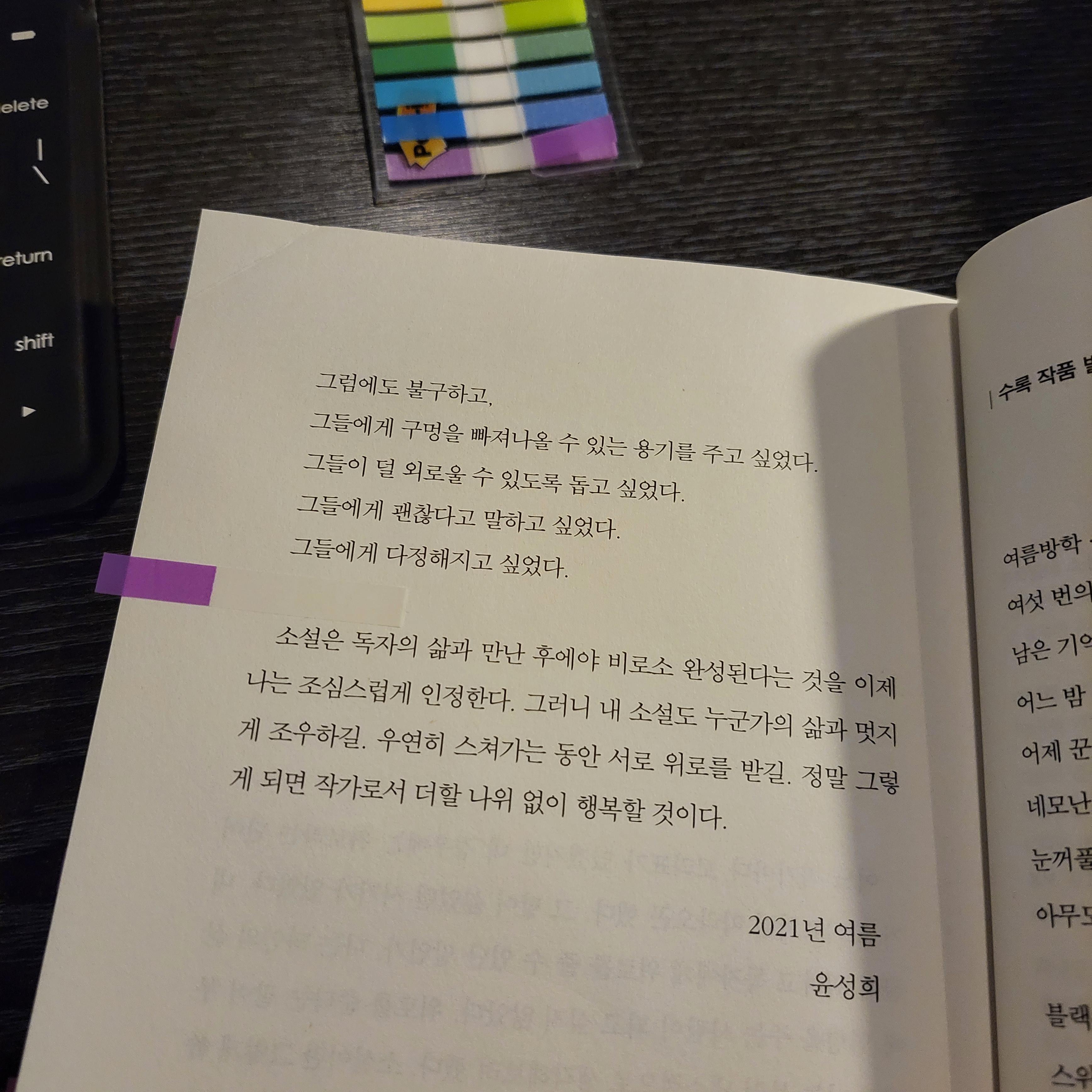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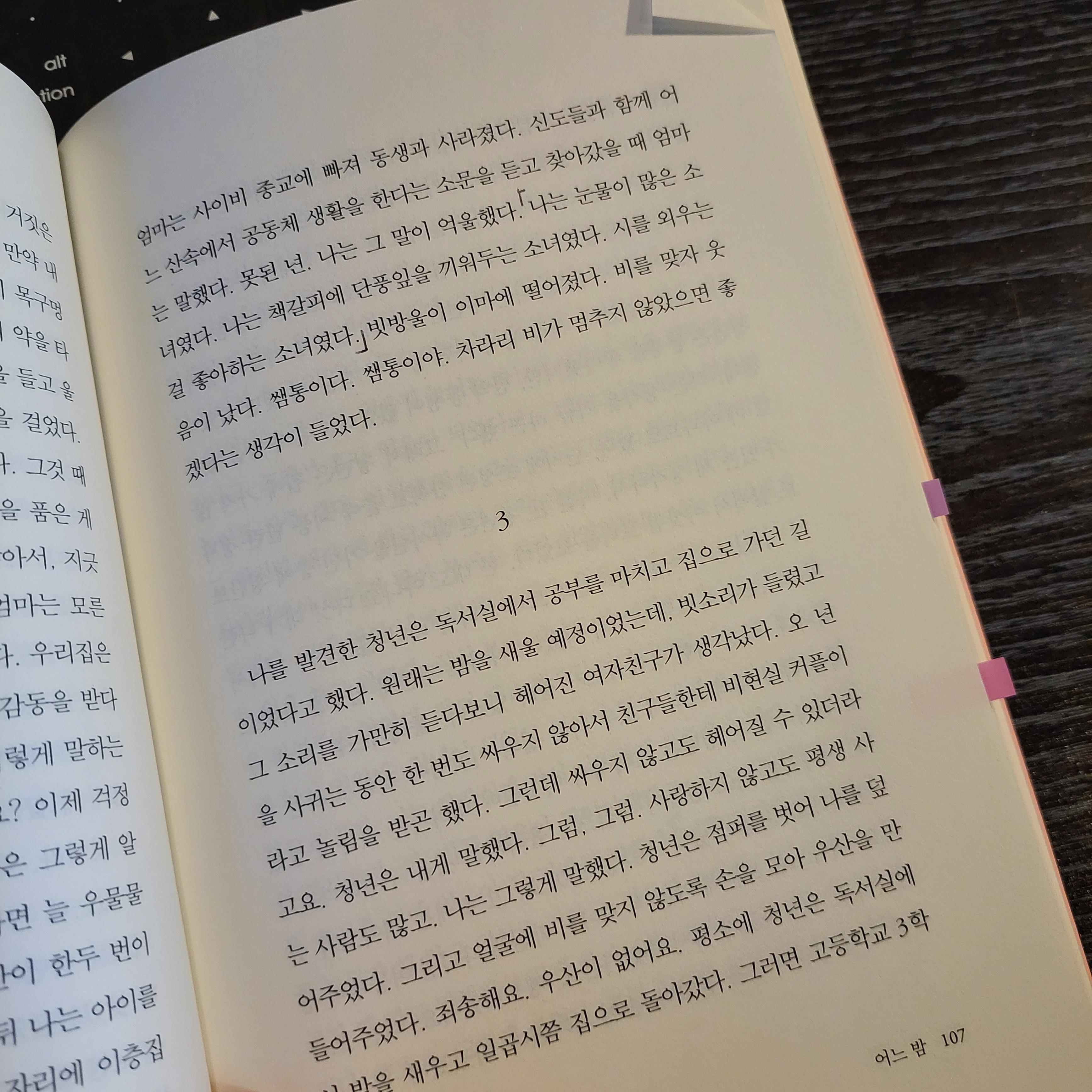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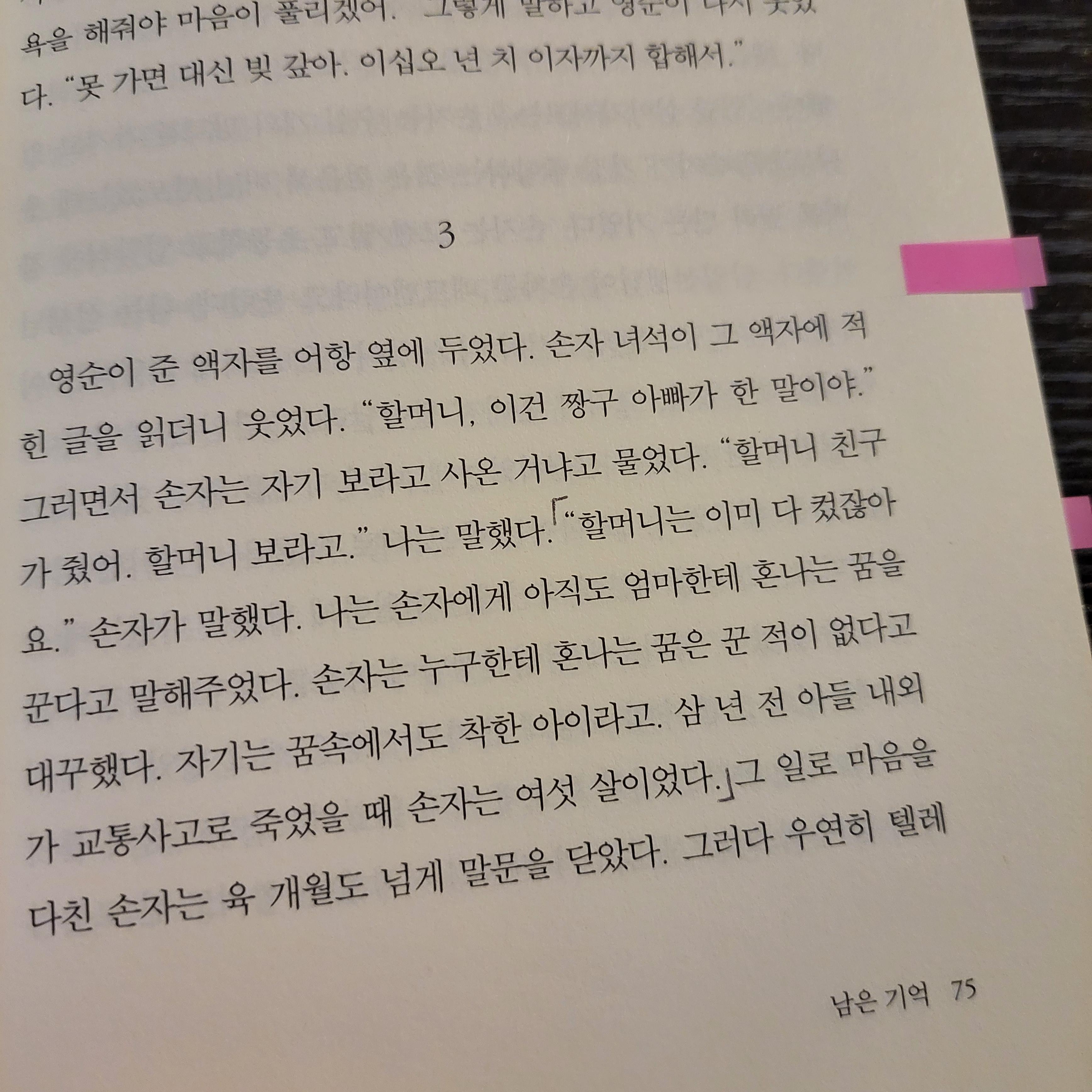
⠀
“할머니는 이미 다 컸잖아요.” 손자가 말했다. 나는 손자에게 아직도 엄마한테 혼나는 꿈을 꾼다고 말해주었다. 손자는 누구에게 혼나는 꿈은 꾼 적이 없다고 대꾸했다. 자기는 꿈속에서도 착한 아이라고. 삼 년 전 아들 내외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손자는 여섯 살이었다.
(75쪽, 「남은 기억」)
'책 속에 머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룰루 밀러의 논픽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2021, 곰출판) (0) | 2022.03.09 |
|---|---|
| 룰루 밀러의 논픽션 혹은 에세이 혹은 전기 혹은 서평,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Why Fish Don’t Exist, 2021) (0) | 2022.02.22 |
| 2021년 12월 31일 - 2022년 1월 1일, 극장칸, 강민선, 관객의 취향 (0) | 2022.01.01 |
|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정혜윤 - 목소리, 이름, 우리, 인생의 전문가 (0) | 2021.12.18 |
| 글이 적힌 종이는 두 가지 시간을 살게 한다 (0) | 2021.11.22 |


